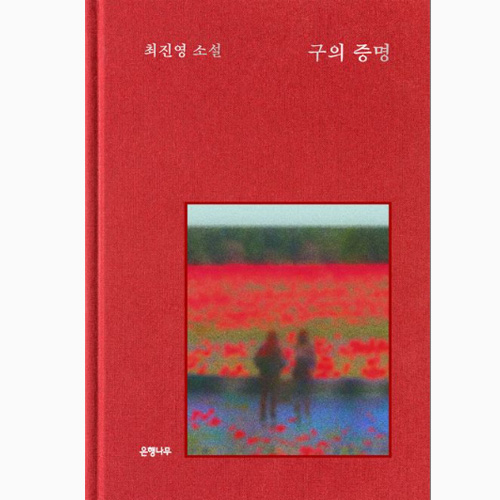
계속 생각나게 되는 줄거리
처음엔 별생각 없이 펼쳤다. 친구가 자살한 이야기라는 설명만 들었고, 사실 그런 얘기는 이제 흔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 책은 이상하게 다르다. 누군가의 죽음에서 시작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그 사이를 맴도는 것 같다.
구. 친구의 이름이다. 주인공은 구가 죽은 후에도 자꾸 구를 생각한다. 같이 걷던 골목, 말없이 앉아 있던 계단, 흔적처럼 남은 유서.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다. 유서를 찾는 건지, 자기 자신을 찾는 건지.
이야기의 흐름은 매끄럽지 않다. 갑자기 과거로 튀고, 주인공의 생각이 쏟아지고, 장면이 뒤섞인다. 그래서 좀 불친절하다.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누군가를 잃은 사람의 머릿속을 그대로 옮겨 놓은 느낌이 든다. 아무 말도 없는 장면에서 울컥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 별일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에 남는 장면. 그런 게 많다.
끝까지 읽고 나면, 결국 이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누구 하나가 사라지고, 남은 사람이 계속 살아가는 일. 남겨진 사람들이 뭘 붙잡고, 뭘 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명대사 - 지나치기엔 너무 조용한 문장들
책을 읽다 보면, 문장 하나에 자꾸 멈추게 된다. 특히 아래 문장은 자꾸 되뇌게 됐다.
“구가 없는데도 나는 살아 있고, 살아 있다는 것이 이렇게 견디기 힘들 줄은 몰랐다.”
이 말,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알 것 같았다. 살아 있는 게 왜 죄처럼 느껴지는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장은 그런 경험을 대신 얘기해 주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를 닮아가다가 끝내 닮지 못했다.”
이건 뭐랄까, 딱 사람 관계라는 게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같이 있는 시간이 길다고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그건 분명하다.
“죽음을 택한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외면할 수는 없다.”
이 문장은, 그냥... 무너졌다. 자살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몰라서 불편했던 내 마음을, 정확히 짚어줬다. 이해는 못 해도 외면은 못 한다는 그 말. 그 말 하나로 책 전체가 정리된 느낌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 구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내 친구 중에도 저런 애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 내가 구였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석 - 도대체 뭘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
제목이 ‘구의 증명’인데, 처음엔 그 뜻을 잘 모르겠더라. 구가 뭔가를 증명했다는 건지, 주인공이 구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는 건지. 근데 끝까지 읽고 나서도, 여전히 잘 모르겠다.
다만 그런 생각은 들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애쓴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거. 죽은 사람의 흔적을 따라가는 일. 그게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나를 마주하게 된다. 내가 왜 살아 있는지, 왜 하루하루를 버티는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유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이 소설은 자살에 대해 말하는 듯하면서도, 그걸 미화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쉽게 단정 짓지도 않는다. 오히려 말없이 버티는 사람들의 표정을 오래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더 조용하게 파고든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내가 이 책에서 가장 오래 머문 건, ‘구’라는 인물도 아니고, 주인공도 아니고, 그 둘 사이에 흘러다니는 공기 같은 무언가였다. 설명되지 않고, 그냥 있는 그 무언가.
다 읽고 나서도 남는 게 많다. 뭔가 깨달은 건 아니고, 오히려 더 모르게 된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자꾸 생각난다. 별로 길지 않은 책인데도, 그 안에서 내가 오래 걷고 있었던 느낌이 든다.
책장 덮은 뒤에도 이상하게 조용해지지 않는다. 구가 그랬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