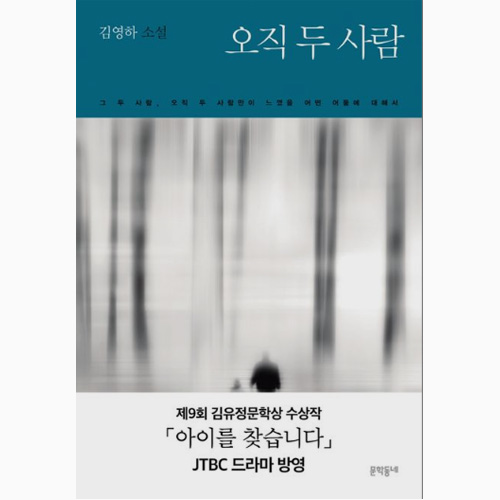
- 가볍게 읽을수 있겠다 싶어서 샀던 김영하 작가의 소설, 잊고 있다가 어느날 밤에 잠이 안와서 보게 되었다. 그러다 하룻밤에 다 읽게 되었는데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것 같다. 각각의 단편마다 여러 감정을 느낄수 있었다.
김영하 작가 '오직 두사람'
김영하 작가 글은 처음부터 ‘거리를 둔다’는 느낌이 든다.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도 직접 건드리지도 않는다. 그저 한 발 물러서 있는 느낌이다.
'오직 두 사람'도 그렇다. 특히 표제작 <오직 두 사람>은 첫 문장부터 이상하게 차갑다. 정제된 문장인데, 감정은 불쑥 끊겨 있다. 그 끊김이 계속된다.
이야기 구조는 단순하다. 아버지와 아들. 그 둘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거리. 근데 그 거리감이 참 묘하다. 누가 먼저 등을 돌린 것도 아니고, 큰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딘가 벌어져 있다.
특별한 장면이 있는 건 아니다. 그냥 담담하게 흘러가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깊이 와닿는다.
가장 이상했던 건, 읽고 난 뒤 기억에 남는 문장이 단 한 줄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이 문장은 반복된다. 그리고 그 반복이 점점 더 낯설어진다. 왜 굳이 그렇게 말해야 했을까. 아버지였다는 걸 설명해야만 했던 거리.
나는 처음에 이 단편이 좀 밋밋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몇 장면이 머리에 남아 떠나질 않았다. 말이 적은데, 말보다 많은 걸 남기는 글. 읽을 땐 조용한데, 읽고 나면 마음이 시끄럽다.
이건 설명이 아니라, 여백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인것 같다. 김영하는 특히 그걸 참 잘한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 침묵이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설명 없는 감정들이 더 선명하게 남는다
'오직 두 사람'에는 구구절절한 설명을 붙이지 않는다. <오직 두 사람>뿐만 아니라 <아이를 찾습니다>, <누군가의 불행>도 다 마찬가지다.
<아이를 찾습니다>에 나오는 아버지는 실종된 아이를 기다린다. 그런데 감정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애절하게 울거나 절망에 빠지는 장면이 없다. 그냥 조용히 기다릴 뿐이다. 이상하게, 그래서 더 아팠다.
사건이 아니라 ‘기억의 흐름’에 가까운 문장들. 그 안에 남은 감정.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 그런 게 많았다.
그리움, 상실, 서운함 같은 것들이 딱 잘라서 표현되진 않지만, 읽다 보면 몸 어딘가가 반응한다. 나는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느꼈다.
김영하의 문장은 대체로 짧다. 군더더기가 없다. 그런데 그 간결함이 감정을 죽이지 않는다. 오히려 더 살아 있다.
그가 던진 한두 문장이, 가끔 마음을 툭 치고 지나간다. 별말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말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지나쳤던 감정들이 자꾸 떠오른다. 어떤 날에 했던 생각, 말하지 못했던 마음 같은 것들.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이것도 이야기였구나.' 누군가의 기억도, 나의 기억도.
말로 다 정리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명확하게 남는 것. 이게 김영하 소설의 매력이고, '오직 두 사람'의 힘이기도 하다.
단편의 밀도와 공기의 온도
이 단편집은 전체적으로 짧은 편이다. 어떤 이야기는 정말 금방 읽힌다. 하지만 속도감이 빠르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천천히, 무겁게 들어온다.
<누군가의 불행>이라는 단편을 읽을 땐 그게 더 분명했다. 아무 일도 없는 이야기 같은데, 이상하게 읽고 나면 뭔가 꺼림칙하다.
말하지 못한 감정, 껄끄러운 인간관계, 무심한 말투. 그 틈에서 느껴지는 불편함. 실제로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있을 법한 공기다.
김영하는 공간이나 시간, 배경을 거의 설명하지 않는다. 온도도 없다. 그런데도 나는 그 장면들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문장 사이의 공기, 말하지 않은 여백들이 그걸 만들어낸다. 꽉 채운 설명이 아니라, 느껴지는 분위기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 그게 이 책 전반에 흐르고 있다.
누군가는 이런 단편을 ‘심심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상하다. 읽는 동안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생각나기 시작한다.
문장으로 설명되지 않은 감정들이, 오히려 더 오래 머문다. 이해한 건 없는데, 무언가 남았다는 기분.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하다.
'오직 두 사람'은 문장보다, 문장 사이의 정적이 더 인상적인 책이다.
'오직 두 사람'은 짧고 조용하다.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데도 어딘가 아프고, 오래 기억에 남는다.
관계, 상실, 말하지 못한 감정들. 그 조용한 이야기들이 몸 어딘가에 머무는 느낌. 나는 이게 바로 김영하 문장의 정체라고 생각한다.
한 줄의 문장이 끝났는데도, 생각은 계속 이어진다. 침묵이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이 책이 보여준다.
결론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다. 그냥, 그렇게 남아 있는 문장들. 그리고 그 문장들 사이에서 문득 스쳐 간 감정들. 그게 '오직 두 사람'을 기억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은 게 더 오래 남을 때가 있다. 이 책이 그런 식이다. 아주 조용하게. 그런데 잊히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