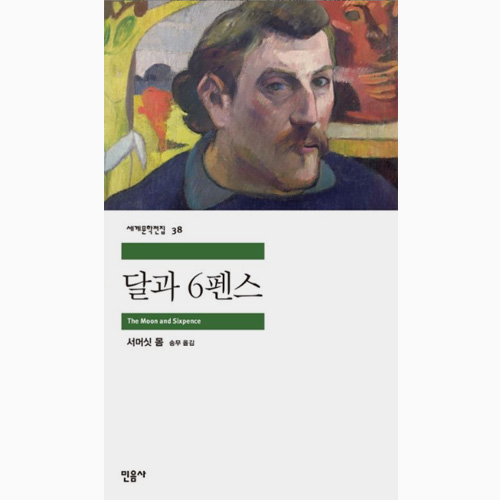
서머싯 몸의 '달과 6펜스'는 오래된 소설이다. 백 년 전 이야기인데, 여전히 지금 읽어도 질문이 날카롭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살겠느냐고, 슬쩍 등을 떠민다. 현실을 붙잡을지, 아니면 꿈 쪽으로 몸을 던질지. 예술과 생존, 자유와 책임, 이상과 타협 사이에서 갈팡질팡해본 사람이라면 이 소설이 마냥 남 얘기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감동보다는, 조금 불편한 거울에 가깝다
돈 대신 그림을 택한 남자
주인공 찰스 스트릭랜드는 런던에서 증권 중개인으로 무난한 삶을 살던 중년 남자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과 직장을 버리고 파리로 떠난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여기서부터 마음이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 그는 가족을 버렸고, 책임을 외면했다. 말투는 무례하고 행동은 이기적이다. 솔직히 좋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소설은 그를 완전히 나쁜사람으로 그리지 않는다. 오히려 예술가로서의 어떤 ‘순도’를 끝까지 붙들고 간다.
그림을 위해서라면 사회의 규칙도, 타인의 기대도 개의치 않는다. 서머싯 몸은 이 인물을 앞에 세워놓고 계속 묻는 것 같다. 예술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 하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 걸까.
모든 것을 버려서 완성한 그림. 그 그림에 감동한 사람들은 과연 그의 삶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작가는 끝내 답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찝찝하고, 그래서 더 오래 남는다. 2025년에 이 소설이 다시 읽히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삶을 버린 걸까, 되찾은 걸까
스트릭랜드는 파리를 거쳐 타히티까지 흘러간다.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자기만의 색을 찾고, 예술가로서 완성된다. 대신 대가는 혹독하다. 고립, 병, 그리고 죽음.
그는 끝내 타인의 삶을 배려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는다.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는 타협하지 않는다. 삶 전체를 걸고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남긴다. 이걸 자기 실현이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이기적인 도피였다고 해야 할까.
소설은 그 경계 어딘가에 우리를 세워둔다. 스트릭랜드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런 선택을 한 번쯤 상상해보지 않은 사람도 드물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술가만의 전기가 아니라, 다른 삶을 몰래 꿈꿔본 적 있는 사람 모두의 이야기처럼 읽힌다.
현실에 지친 사람에게 이 책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달과 6펜스 사이에서 줄을 재고 있으니까.
달은 낭만일까, 자기기만일까
제목은 흔히 이렇게 풀린다. 하늘의 달을 보느라 발밑의 6펜스를 놓치는 사람. 그런데 스트릭랜드는 조금 다르다. 그는 6펜스를 일부러 내려놓고 달을 택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를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비판한다. 아마 그만큼 우리는 달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안전한 선택을 하며, 그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서머싯 몸은 이상주의의 위험한 아름다움과, 현실주의의 어중간한 안정을 동시에 보여준다. 스트릭랜드는 극단적이다. 그래서 그의 삶은 불편하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질문이 튀어나온다.
지금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 달은 무엇이고, 6펜스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이 소설을 오래 살아 있게 만든다. 시대가 바뀌어도, 예술과 삶에 대한 고민은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
'달과 6펜스'는 정답을 주지 않는다. 스트릭랜드의 선택은 숭고하지도, 완전히 추하지도 않다. 그는 그냥 자기 쪽을 택했을 뿐이고, 우리는 그 결과를 지켜봤을 뿐이다.
2025년의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다.달을 볼 것인가, 6펜스를 쥘 것인가.아니면 그 사이에서 계속 망설이고 있는가.
아마 그 망설임 자체가, 이 소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