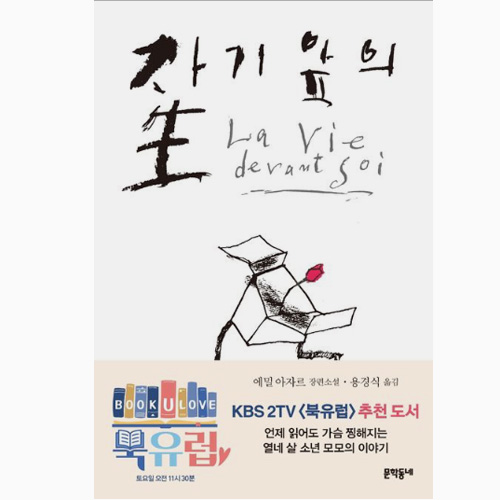
에밀 아자르(로맹 가리)의 '자기 앞의 생'은 소년과 노인의 이야기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걸 품고 있다. 중요한건 이상하게도 2025년을 사는 지금, 이 이야기가 더 무겁게 다가왔다. 타인의 고통을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사랑이라는 말이 실제 삶에서는 어떤 얼굴을 하는지, 존엄은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 소설의 문장들이 왜 지금 다시 붙잡히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본 기록이다.
“삶은 누구에게나 자기 앞에 있다”는 문장
'자기 앞의 생'이라는 제목은 참 묘하게 남는다. 책을 덮고 나서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 다시 떠올릴 때도 그렇다. 읽을 때마다 이 말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는것 같다. 처음엔 그냥 시적인 표현처럼 느껴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선언처럼 들렸다.
에밀 아자르가 그려낸 세계에는 미화가 없다. 파리의 뒷골목, 노년의 로자 아줌마, 이민자 아이 모모. 제도와 보호의 경계 밖에 밀려난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삶이 비어 있지는 않다. 사랑도 있고, 기억도 있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존엄도 있다. 그게 이 소설을 쉽게 넘길 수 없게 만든다.
모모의 1인칭 시점으로 이어지는 문장들은 종종 엉뚱하다. 웃음이 나기도 한다. 그런데 그 가벼움 뒤에 현실이 숨어 있다. 아동 성매매, 인종차별, 정신질환, 노년의 고독 같은 것들. 설명하지 않는데, 다 보이게 만든다. 아이의 눈을 빌려서.
모모는 세상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대신 보고, 곁에 있고, 버틴다. 말이 많지 않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 같다. 설명하지 않는 대신 견디는 방식. 그게 모모의 생존법이다.
이 소설이 말하는 건 거창한 감정이 아니다. 소리 없이 함께 있는 시간, 그 작고 느린 동행에 가깝다. 그래서 더 오래 남는다.
문장 하나가 삶 전체를 품고 있을 때
'자기 앞의 생'을 읽다 보면 문장이 종종 매끄럽지 않다고 느낄때가 있다. 어딘가 어색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덕분에 더 진짜처럼 느껴진다.
“나는 로자 아줌마를 싫어한 적이 없어요.”
이 문장은 감정을 부풀리지 않고 설명도 없다. 그런데 읽고 나면 마음 한쪽이 묘하게 조용해진다. 모모의 말투는 서툴러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랄 만큼 섬세하고 예리한 감정이 숨어 있다.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나는 자주 멈췄다. 이 책은 속도있게 술술 읽는 소설이 아니다. 몇 줄 읽고 고개를 들게 된다. 괜히 생각이 길어진다.
가장 오래 남은 문장은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였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는 사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로자 아줌마였는지, 모모였는지.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 문장이 내 안에 남아 있다는 게 더 중요했다.
책을 덮은 뒤에도 문장들이 자꾸 돌아왔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여전히 모르겠는데, 적어도 어느 쪽을 향해 서야 할지는 살짝 보이는 느낌. 그런 순간이 있었다.
요즘은 모든 게 빠르다. 책도, 뉴스도, 관계도 금방 지나간다. 그래서인지 더더욱, 오래 머무는 문장이 필요해진다. '자기 앞의 생'은 그런 문장들을 품고 있다. 어설프게, 때로는 삐뚤게. 그래서 더 믿게 된다.
우리가 모모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모모는 현실적으로 보면 ‘약자’다. 아랍계 이민자, 보호자 없이 시설을 전전하는 아이. 제대로 된 교육도, 안전한 가정도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앞의 생'에서 모모는 누구보다 튼튼하다. 감정적으로는 무심한 척하지만, 로자 아줌마를 보살피는 태도를 보면 묘한 따뜻함이 느껴진다.
그는 의무감이 아닌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간다. 그 모습이 요즘 시대의 청년들과 겹쳐 보인다. 불안한 사회, 약해 보이면 밀려나는 구조 속에서 감정을 애써 숨기고, 책임질 수도 없는 삶을 어깨에 얹은 사람들. 나는 모모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누군가의 삶을 끝까지 곁에서 바라본다는 건,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존재를 지지하는 일이라는 것. 모모는 로자 아줌마의 마지막을 함께한다. 무겁지만 피하지 않는다. 그가 했던 선택은 ‘착한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대답이었다. 이 소설은 그걸 억지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보여준다. 설명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크게 와닿는다. 우리는 왜 이 책을 다시 읽어야 할까. 아마도 지금 우리 곁에도 ‘자기 앞의 생’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때로는 나 자신도 포함해서.
'자기 앞의 생'은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 다시 읽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사랑, 책임, 존엄, 연대. 너무 많이 말해 식상해진 단어들이, 이 소설 안에서는 다시 살아난다. 그건 아마 모모가 말하는 방식 때문일지도 모른다. 담백하지만 미묘한 감정, 낯설지만 정확한 문장들. 그 덕분에 이 책은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는다. 2025년. 세상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같은 질문이 남아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 조용히 놓이는 책, '자기 앞의 생'이 그 중 하나다.
현실적으로 보면 모모는 약자다. 아랍계 이민자 아이, 보호자 없이 시설을 떠도는 존재. 교육도, 안전한 울타리도 없다.
그런데 이 소설 속에서 모모는 이상할 만큼 단단하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척하지만, 로자 아줌마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묘한 온기가 느껴진다. 그는 ‘해야 해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라난다. 책임이라는 말보다, 곁에 있음에 가깝다.
그 모습이 요즘의 청년들과 겹쳐 보였다. 불안한 사회에서 약해 보이면 밀려나는 구조. 그래서 감정을 숨기고, 감당하기 벅찬 삶을 어깨에 얹은 사람들.
모모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의 삶을 끝까지 바라본다는 건, 돌봐주는 일을 넘어서 존재를 인정하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모모는 로자 아줌마의 마지막을 함께한다. 무겁다. 쉽지 않다. 하지만 피하지 않는다. 그 선택은 ‘착함’이라기보다, 함께 살아온 방식에 대한 응답처럼 느껴졌다.
이 소설은 그걸 설명하지 않는다. 판단도 없다. 그냥 보여준다. 그래서 더 크게 다가온다.
우리는 왜 이 책을 다시 읽어야 할까.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기 앞의 생’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끔은, 나 자신도 그 안에 포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