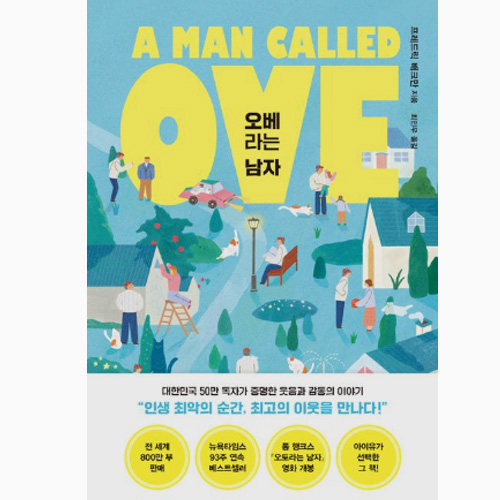
프레드릭 배크만의 '오베라는 남자'는 요란한 위로 대신, 묵묵하게 슬쩍 건네는 이야기다. 무뚝뚝하고 고집 센 이웃 노인 오베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요즘 누구를 향해 마음을 쓰고 있을까.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소설이 여전히 읽히는 이유를, 나는 오베의 하루를 따라가며 다시 생각하게 됐다.
오베라는 남자, 말 없는 삶의 무게
처음엔 솔직히 가볍게 시작했다. 괜히 툴툴대고, 이웃 일에 간섭하고, 규칙 어기는 사람을 그냥 못 지나치는 노인. 웃기려고 만든 캐릭터 같았다.
'오베라는 남자'의 첫인상은 딱 그랬다. 까칠하고, 고집 세고, 잔소리 많은 사람.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무뚝뚝함 안쪽에서 묘한 온기가 느껴진다. 바로 드러나진 않는다. 조금 느리게, 조금씩.
오베는 아내를 잃은 뒤, 살아는 있지만 삶에서는 한 발 물러난 사람이다.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꺼낼 자리가 없어진 사람에 가깝다. 들을 사람도, 기대할 사람도 없는 상태. 그런데도 그의 안에는 아직 식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다.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뿐이다.
이 지점이 유독 마음에 걸렸다. 요즘처럼 관계가 번거롭게 느껴질 때, 말보다 침묵이 편해질 때. 오베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도 떠올랐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 괜찮은 척은 하지만 사실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사람.
읽는 동안 웃다가도 자주 멈췄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문장 뒤에 오베의 삶 전체가 스며 있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왔다.
잃어버린 관계, 다시 연결되는 마음들
이 소설이 따뜻하게 남는 건 오베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고요한 고립은 이웃이라는 예고 없는 변수들로 조금씩 흔들린다. 파르바네와 그녀의 가족, 말 없는 청년,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 다들 허락도 없이 오베의 삶 안으로 들어온다.
처음엔 밀어내고, 귀찮아하고, 화를 낸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오베는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말은 여전히 적지만, 행동이 달라진다. 그 변화가 크지 않아서 더 진짜처럼 느껴진다.
나는 그 장면들이 좋았다. 누군가를 바꾸겠다고 애쓰지 않는 태도. 그냥 곁에 있는 사람들. 오베는 그 온기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마음을 연다. 아주 조금씩.
파르바네가 계속 말을 걸고, 아이들이 거리낌 없이 다가가는 모습은 설명보다 강하다. 가까워진다는 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의 문제라는 걸 이 책은 보여준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일 수 있지 않을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삶의 결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오베 역시 그렇게 다시 살아간다. 이유 없이 버티던 날들이, 누군가를 위한 하루로 바뀌는
슬픔을 견디는 방식이 각자 다를 뿐
오베는 세상과 잘 섞이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내 소냐는 그런 오베를 있는 그대로 이해했다. 그녀가 떠난 뒤, 오베는 자꾸 죽음을 떠올린다. 시도는 반복되지만, 번번이 누군가에게 가로막힌다.
그 장면들은 슬픈데 묘하게 웃음이 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다음 날을 맞이할까.
슬픔은 꼭 큰 울음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오베가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를 돌고, 규칙을 점검하는 모습은 자기 방식대로 삶을 붙잡는 행위처럼 보였다. 무너질까 봐, 더 단단하게 반복하는 것.
그걸 누가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 말없이 슬퍼하는 사람도, 조용히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다. 다만 표현이 다를 뿐이다.
'오베라는 남자'는 그 차이를 존중한다. 울지 않아도 괜찮고, 웃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한다.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도 된다고.
책을 덮을 즈음, 오베는 더 이상 까칠한 노인이 아니다. 자기 속도로 사람들 곁에 남아 있는 한 사람이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그냥 곁에 머무는 존재로.
'오베라는 남자'는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감정을 몰아붙이지도 않는다. 대신 하루가 쌓이고, 관계가 이어지고, 삶이 조금씩 움직인다.
지칠 때, 외로울 때, 말 없는 사람 옆에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살게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그 이야기를 서두르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남겨둔다. 그래서 읽고 난 뒤에도 오래 생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