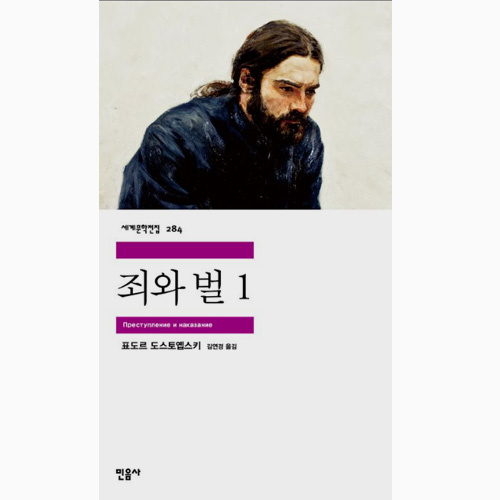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은 흔히 범죄 소설로 분류되지만, 그러기에는 어딘가 부족하다. 이 이야기는 살인보다 그 이후를 오래 붙잡는다. 죄의식이 어떻게 사람을 갉아먹는지, 구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겁고 멀리 있는지를 고집스럽게 따라간다. 1860년대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지만, 읽다 보면 시간 감각이 흐려진다. 인간의 본질을 정면으로 건드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소설은 지금도 갑자기, 벼락처럼 다가온다.
'죄와 벌' 줄거리 요약
라스콜리니코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가난한 대학 중퇴생이다. 돈도 없고, 미래도 흐릿하다. 그는 무기력한 현실을 견디다 못해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낸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인간은 법 위에 설 수 있다는 생각. 그 확신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전당포 노파를 죽인다.
처음엔 계산된 범죄처럼 보인다. 하지만 모든 건 예상보다 빠르게 어그러진다. 현장에 나타난 노파의 동생까지 죽이면서, 살인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다. 완전범죄를 꿈꿨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경찰보다 더 집요한 무언가다. 자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불안과 혐오, 그리고 이유 없는 공포.
이 소설의 긴장은 추격전이나 반전에서 나오지 않는다. 라스콜리니코프의 머릿속에서, 심장 안에서 벌어진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붙들고 싶어 하지만, 죄책감은 끈질기다. 소냐와의 만남, 포르피리와의 대화, 라주미힌의 존재는 그를 조금씩 흔들어놓는다. 결국 그는 무너진다. 자수를 선택하고 시베리아로 향한다.
하지만 거기서 모든 게 끝나지는 않는다.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배우는 시간에서 시작된다.
작가 도스토옙스키, 삶 자체가 문학이었다
'죄와 벌'을 읽다 보면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이 겹쳐 보인다. 그는 실제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총살 직전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이후의 시베리아 유형 생활은 그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죽음을 눈앞에서 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문장이 있다면, 그의 글이 그렇다.
그의 소설에는 늘 신과 인간, 자유와 책임, 구원과 절망이 뒤엉켜 있다. 이는 철학적 장식이 아니라, 그가 몸으로 겪은 질문들이다. '죄와 벌'은 이후에 쓰일 『백치』와 『악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로 이어지는 세계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는 이야기꾼이라기보다, 인간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상가에 가깝다.
사상은 어떻게 범죄가 되는가
이 소설에서 가장 섬뜩한 부분은 범죄 그 자체가 아니다. 라스콜리니코프를 움직인 생각이다. 그는 배가 고파서, 분노에 차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 ‘위대한 인간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나폴레옹을 떠올리며, 자신도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여겼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인물을 통해 당시 러시아에 퍼져 있던 극단적인 이성 숭배와 무신론을 비판한다. 신을 지우고, 이성만으로 세계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결국 인간을 더 잔인한 곳으로 데려간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점점 비이성적인 상태로 무너진다. 생각은 날카로웠지만, 마음은 따라오지 못했다.
소설은 묻는다.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누군가의 목숨을 넘어서도 괜찮은가. 그리고 진짜 벌은 감옥에 있는가, 아니면 잠들 수 없는 밤들 속에 있는가.
도스토옙스키에게 사상은 무기다. 세상을 바꿀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을 완전히 부숴버릴 수도 있다.
'죄와 벌'은 고전이라는 말로 정리되길 거부한다. 지금 읽어도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나는 어떤 인간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이상을 품고 있으면서도 현실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들, 혹은 이상을 핑계로 선을 넘고 싶은 유혹.
2025년을 사는 우리 역시 이 소설의 무게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작품은 아직 살아 있다. 문장 하나가 갑자기 가슴을 치는 순간이 있다.
그 불편함 때문에, '죄와 벌'은 여전히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