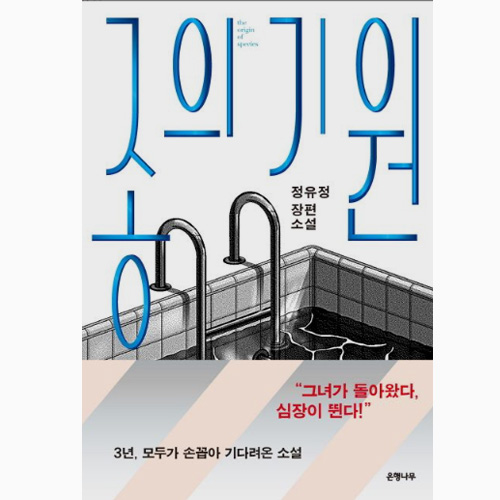
정유정의 장편소설 '종의 기원'은 흔히 말하는 ‘재밌는 스릴러’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작품입니다. 사건이 세고 전개가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읽는 사람을 끝까지 불편하게 붙잡아 두기 때문이죠. 이 소설은 누가 범인인지보다, 인간 안에 숨어 있는 본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다 읽고 나면 무섭다기보다, 마음이 묵직해집니다. '종의 기원'은 범죄 이야기를 빌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들여다보는 심리 스릴러에 가깝습니다.
본능을 따라가는 서사가 만들어내는 압도적 긴장감
'종의 기원'은 처음부터 큰 사건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엔 “이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싶은 감정들이 조금씩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그 감정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어느 순간 독자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사람, 어디까지 가는 걸까?”
정유정은 긴장을 급하게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단서, 미묘한 시선, 설명되지 않은 감정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 덕분에 이야기는 점점 숨이 막히듯 조여 옵니다. 읽는 동안 페이지를 넘기는 손은 빨라지는데, 마음은 계속 불편합니다.
이 소설이 특히 인상적인 이유는 선과 악을 분명히 나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독자는 주인공의 생각을 가까이에서 따라가게 되고, 그 안에서 이해와 거부 사이를 계속 오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동요가 바로 '종의 기원'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입니다.
정유정이 그려낸 인간 본성의 얼굴
'종의 기원'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폭력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안에 있던 것이, 아주 조금씩 드러날 뿐입니다.
주인공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독자는 그의 생각을 지나치게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공감하고 싶지는 않은 지점에 계속 서게 되니까요. 정유정은 바로 그 지점을 노립니다.
인간을 쉽게 선하거나 악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 그 모호함 자체를 이야기의 중심에 둡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가족과 관계입니다. 보호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던 관계가, 어떻게 한 인간의 내면을 비틀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보여줍니다.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던 이야기가, 어느새 환경과 구조의 문제로 확장되는 순간이 인상적입니다.
한국 스릴러 소설에서 '종의 기원'이 갖는 의미
'종의 기원'이 오래 이야기되는 이유는 단순히 자극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스릴러로서의 재미는 분명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 읽는 동안보다 읽고 난 뒤에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정유정은 이 책을 통해 한국 스릴러가 단순한 범죄 재현을 넘어서, 인간 심리와 철학까지 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종의 기원'은 장르소설이면서도, 분명한 문학적 무게를 지닙니다.
책을 덮은 뒤에도 이야기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인'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종의 기원'은 편하게 읽고 덮을 수 있는 소설은 아닙니다. 대신 인간이라는 존재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눈을 돌릴 수 없고, 무섭지만 끝까지 읽게 되는 이야기죠.
정유정은 이 작품을 통해 스릴러라는 장르 안에서 인간 본성의 어두운 얼굴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존재인지 고민해보고 싶다면, '종의 기원'은 충분히 그 질문을 던질 만한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