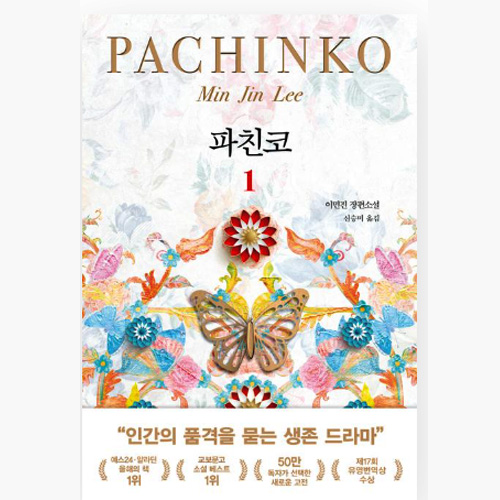
'파친코'는 한국계 미국 작가 이민진이 쓴 장편소설로, 한 가족의 역사를 따라가며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묻는 작품입니다. 나라 잃은 시대를 지나 이방 땅에서 버텨야 했던 사람들의 삶, 그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사랑했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독자들이 이 소설에 울컥했고, 특히 삶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40대에게는 남의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그냥 감동적인 소설을 넘어, 가족과 사회, 개인의 삶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을까”를 조용히 돌아보게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세대, 그들의 이야기
'파친코'는 20세기 초 조선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일본에서 4대에 걸쳐 살아가는 한 가족의 시간을 따라갑니다. 중심에는 선자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를 낳고 키우며 어떻게든 하루를 이어가는 사람이지요. 그녀의 삶은 한 번의 큰 결정보다, 하루하루 작은 선택들의 연속이고, 그 선택들이 결국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됩니다.
지금의 40대는 어릴 때 부모님의 희생을 보며 자랐고, 이제는 자신의 아이와 노부모 사이에 서 있는 세대입니다. 하고 싶은 말, 터뜨리고 싶던 감정을 눌러가며 “괜찮다”를 입에 달고 살았지요.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다가, 정작 자기 마음은 뒤로 밀어 두고 살아온 시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파친코』를 읽다 보면, 선자의 침묵과 인내가 그냥 소설 속 이야기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도 그랬지”, “나도 비슷하게 버텨왔지” 하는 생각이 슬며시 떠오릅니다. 선자는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같은 문제 앞에 서는 삶을 반복합니다. 그 모습이 지금 40대가 지나온 인생과 이상할 만큼 겹쳐 보입니다.
이 소설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슬픈 사건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책을 읽다가 목이 메이는 순간은, 선자의 삶이 내 이야기 같고, 내 가족 이야기 같아서입니다. 소설 속 문장이 어느 순간 자기 지난날과 포개질 때, 조용히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현실을 그대로 담아낸 정직한 파친코
'파친코'는 화려한 반전이나 극적인 장치를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조용히 풀어냅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 담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담백함이 오래 남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책을 덮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부모 이야기고, 곧 내 이야기 같았다.”
이민자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 재일조선인으로 불리며 어디에도 온전히 속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은, 한국 현대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40대에게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언어가 달라졌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국적이 바뀐다고 해서 차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선자 가족의 삶 곳곳에 드러납니다.
선자에서 아들로, 손자로 이어지는 세대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가 힘들었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멀어지기도 하고, 끝끝내 다가가지 못한 채 평생을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내 가족을 떠올리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거리, 자녀와의 거리,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 같은 것들이 떠오르지요.
무엇보다 이 소설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모든 고통을 버텨낸 건, 결국 사랑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눈부신 로맨스가 아닙니다. 가진 것 없어도 자식 입에 밥 한 숟갈 더 넣어주려는 마음, 창피하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버티는 하루, 가족을 어떻게든 안전한 자리로 옮겨 놓으려 발버둥 치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그런 사랑의 얼굴은 지금의 40대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무게와 가치, 40대를 울린 책 이민진 파친코
'파친코'를 읽는 40대는 가만히 앉아 있는 “관객”이라기보다, 이야기 속으로 끌려 들어간 “등장인물”에 가깝습니다. 어느 챕터에서는 선자의 입장이 되고, 어떤 장면에서는 선자의 자녀가 되고, 때로는 그들을 둘러싼 주변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읽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 소설은 대놓고 묻지는 않지만, 계속 마음속에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언제, 어떤 선택을 해왔나요?”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후회하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또 받으며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 질문들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도 『파친코』는 “이게 정답이다”라며 삶을 단정 짓지 않습니다. 대신, 실수 투성이인 선택일지라도 그 나름의 이유와 마음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끝까지 버텨온 삶 자체에 의미가 있음을 조용히 일러줍니다.
살다 보면, 관계가 버겁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내 자리가 어딘지 헷갈릴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파친코』를 읽으면, 외면하고 지나쳤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참느라 묻어둔 감정들, 그냥 지나친 순간들의 무게가 다시 손에 잡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아무도 쉽게 대신해 줄 수 없는 위로로 남습니다.